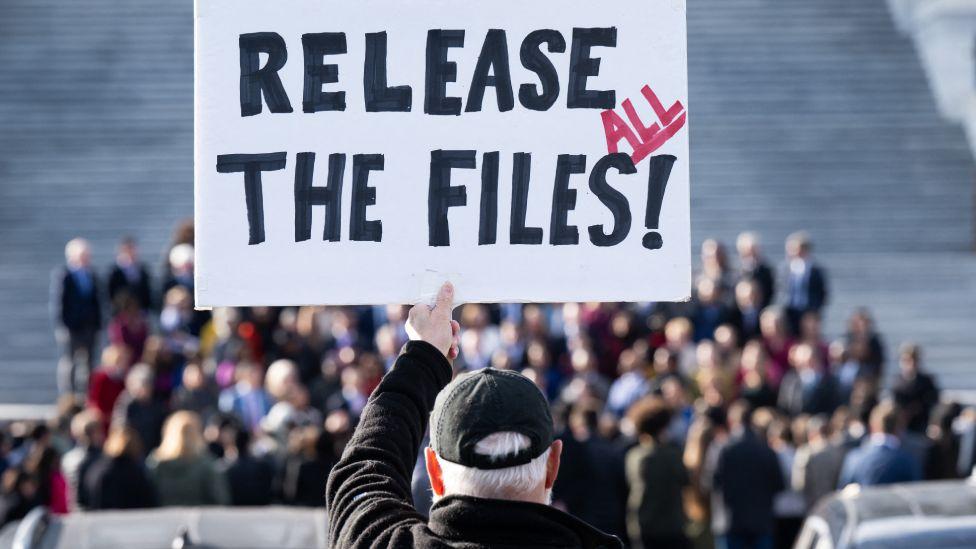엘리자베스 레데러의 초상: 클림트의 이 신비로운 작품이 2억3600만 달러에 팔린 이유
수십 년 동안 대중의 눈에서 사라져 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엘리자베스 레데러의 초상'이 최근 경매에서 현대미술 작품 사상 최고가에 낙찰됐다. 이 작품이 왜 이토록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지 관심이 쏠린다.
'엘리자베스 레데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자신을 후원했던 가문의 딸 엘리자베스 레데러를 그린 전신 초상화다. 비교적 덜 알려진 이 작품은 11월 18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2억3640만 달러(약 3479억8080만원)에 팔렸다.
현대미술 경매 사상 최고가이자, 소더비 경매 역대 최고 기록이다.
2년 전 런던에서 1억800만 달러(약 1589억7600만원)에 낙찰되며 당시 유럽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클림트의 1917~1918년작 '부채를 든 여인'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이번 낙찰가는 2022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9500만 달러(2870억 4000만원)에 거래된 앤디 워홀의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을 제쳤으며, 2017년 4억 5030만달러(6628억4160만 원)에 팔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살바토르 문디'에 이어 역대 미술품 경매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캔버스 속 20대 여성은 반짝이는 흰 비단으로 만든 고치 같은 드레스에 번데기처럼 싸여 있어 기묘한 인상을 준다. 거의 2m에 달하는 이 작품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됐는지는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다.
언뜻 보면 1914~1916년에 그려진 이 회화는 클림트의 대표적 '황금기' 작품들예컨대 1907년작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I'나 1907~1908년작 '키스'에서 보여준 화려함은 다소 줄어든 듯 보인다.
빈 분리파를 상징하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클림트 말년(1918년 55세로 사망)에 그린 이 초상화는 더욱 내밀하고 심리적으로 강렬한 울림을 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장식은 줄었지만, 심층적 아름다움은 오히려 더 풍부하다.
이 작품은 1938년 나치의 오스트리아 병합 당시 레데러 가문의 방대한 클림트 컬렉션과 함께 몰수됐다가 1980년대 초 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이후 화장품 기업 에스티 로더 가문의 상속자 레너드 A. 로더(2025년 6월 별세)가 오랫동안 개인 소장해 왔다.
긴 세월 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져 있던 이 작품은, 어쩌면 그 비밀을 드러낼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얼마였든 간에, 이 신비로운 그림은 결국 재조명될 운명이었다.
작품이 품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는 사실과 상징을 교차시키며 풍부한 감정의 시각적 태피스트리를 만들어낸다. 그 흥미로움은 단순히 그림 속 세계에 머물지 않고, 보는 이의 상상력과 감정을 넘어 확장된다.
'복잡하게 얽힌 문화적 요소들'
'엘리자베스 레데러의 초상'은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빈에서 가장 부유한 유대인 가문 중 하나였던 아우구스트와 세레나 레데러 부부의 딸을 기리는 초상화다. 동시에, 이 작품은 클림트 '황금기'의 마지막 영광을 기록한 작품이기도 하다.
그림 속 젊은 여성은 눈부신 천상의 파란색이 깔린 무대 위에 서 있으며, 주변을 감싸는 섬세한 동양적 장식과 깊은 눈동자가 주는 평온함은 당시 혼란스러운 유럽 현실을 벗어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클림트 이전 작품을 지배했던 금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변모했다. 금빛은 표현주의적 대담함과 감정적 깊이를 담은 생생한 색채로 재탄생했다.
자세히 보면 작품 곳곳에는 도발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디테일이 숨어 있다. 클림트는 엘리자베스가 입은 로브와 가운의 패턴 속에 다양한 상징을 담았다. 이 형태들은 동아시아 미술뿐만 아니라, 클림트가 빈에서 교류하던 과학자들이 탐구하던 미시적 의료 이미지를 절충한 것이다.
특히 의상에 새겨진 용은 청나라 직물을 연상시키며, 우주적 권위와 황제의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물결 문양 속에서 천천히 허벅지를 휘감아 오르는 용의 형상은 원초적 자연과 초자연적 존재를 다스리는 거의 신화적 존재감을 부여한다. 클림트는 단순한 미화나 후원자에 대한 아첨을 넘어, 엘리자베스의 아름다움을 신화적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마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재창조한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동아시아적 요소와 대비되게 클림트는 1903년 빈대학교 해부학 교수이자 친구였던 에밀 주커칸들의 강의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세포와 미시 생물학적 형태를 떠올리며, 더 섬세한 모티프를 작품 곳곳에 숨겼다. 로브의 난형이나 동심원 패턴은 얼핏 꽃무늬처럼 보이지만, 세포 구조를 연상시키는 모티프다. 이는 클림트 초기 작품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비평가들은 이를 그의 배아학·혈액학·생명의 기원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 해석해 왔다.
클림트의 1907년작 '다나에'와 '키스'를 살펴보면, 세포적 형태가 그의 시각적 언어로 일찍부터 응축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제국의 상징과 생물학적 기원을 암시하는 요소를 작품 속에 병치함으로써, 고대 신화와 현대 과학이 만나는 층위에서 예술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만들어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혈통과 정체성에 대한 미묘한 암시가 나중에 나치 통치 시기 엘리자베스의 실제 생존 전략과 묘하게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클림트 사후 수십 년, 유대인 신분이었던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큰 위험에 처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술가 클림트가 사실상의 생물학적 아버지라고 거짓 주장했다. 어머니 세레나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나치는 이 허구를 인정했고, 엘리자베스는 새로운 신분으로 보호받게 됐다.
엘리자베스의 삶은 클림트 초상화 속 이미지처럼 기묘한 변형과 재탄생, 생존을 위한 변주의 역사였다. 클림트가 그린 정교한 의상 질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젊은 여성의 육체는 마치 비단 고치에서 막 나오는 나비를 연상시키며, 우아하게 흘러내리는 드레스는 금방이라도 날개처럼 펼쳐질 듯한 느낌을 준다.
이번 낙찰가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초상화가 담고 있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클림트의 창조적 천재성과 그 가치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